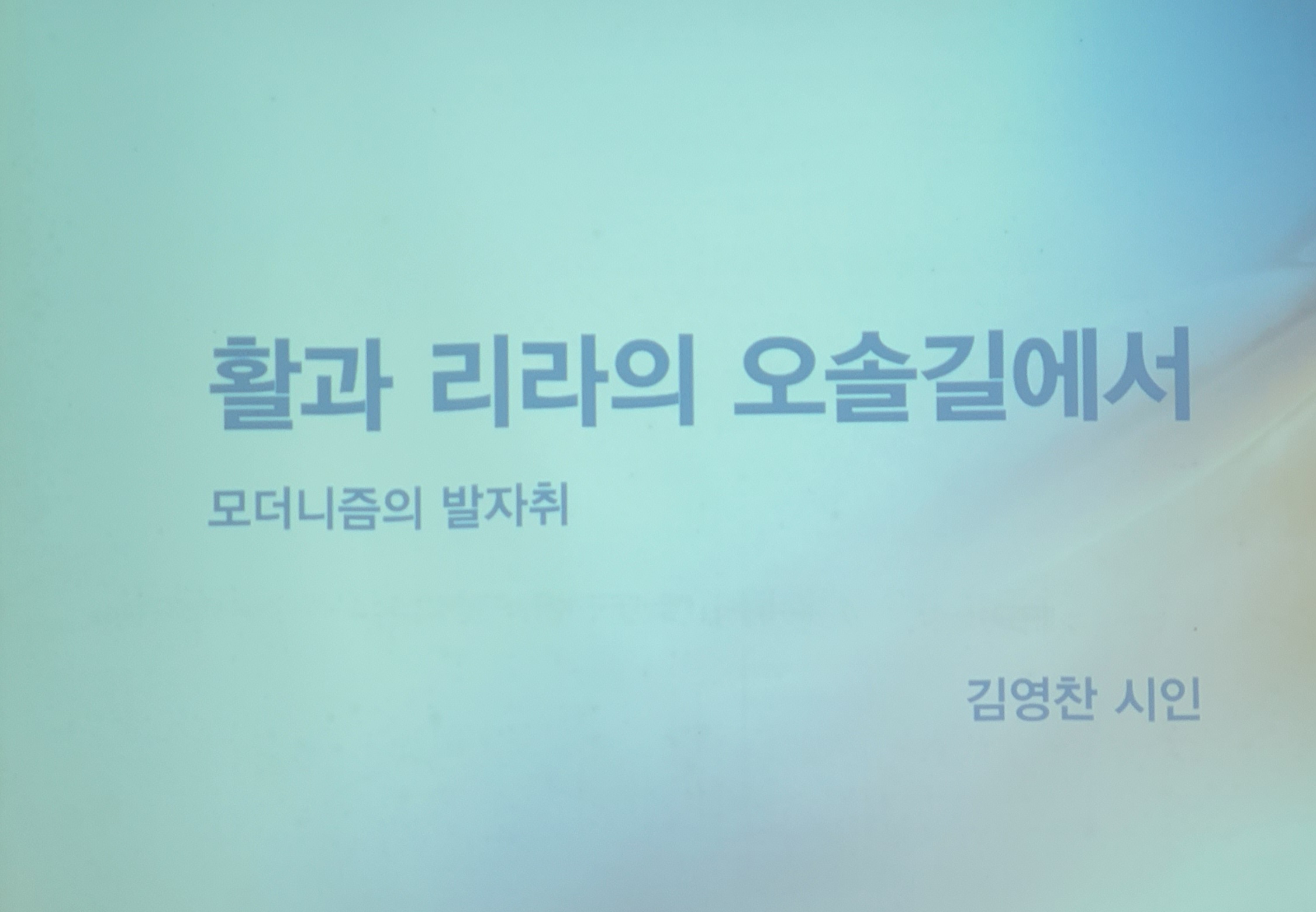
활과 리라의 오솔길에서
-모더니즘의 발자취
김영찬
옥타비오 빠스는, '詩가 시를 쓰게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쏜 화살은 정작 과녁을 향해 날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궁수는 과녁을 맞추고 포수는 사냥감을쏘지만
시인은 펜촉이라는 촉 없는 화살을 과녁 없는 무한 천공에 쏴 올릴 때, 언어에 대하여 예우를 제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
시인이 무한 천공에 쏘아올린 촉없는화살이 수금을 타는 리라현絃의 떨림 위에 멜로디로 이어지는
《활과리라의오솔길>에 우리의 詩는 이슬 맺힙니다^^
시詩란,
1. 인간 감정의 기본이라 할 서정적 파동(波動)이거나
2. 꿈이라고 해야 할 몽환적 몽상(夢想)이거나
3. 무엇보다도 정신을 화들짝 놀라게 할 의식의 소스라침(경련 ‧ 전율)이어야 하지 않을까.
시詩는,
의미(意味)를 강조하면 진부(陳腐)해지고,
의미를 소홀히 하면 공허(空虛)해진다. -황병승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에서는,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른 해체시에 매력을 느낍니다.
소위 메타시(metapoetry)에 경도되어 현실에 깊이 관여하는 앙가주망 시를 쓰기보다는 언어미학에 치중하는 편.
21세기 호모 루덴스로서 당연히 파타피직스(pataphysics)에 방점을 찍는 주이쌍스의 시론을 선호합니다.
논리의 비약은 물론 SF와 VR의 영역을 즐거이 포용하는 핍진성 높은(Aporia에 기반하는) 마술적 리얼리즘의 시.
환상성이 짙은 증강현실(AR)의 무대 위에 하이퍼텍스트 시작법에 경도되고 싶습니다.클리셰의 벽을 넘기 위해 일상에서 몸부림치는 “역설적 앙가주망의 시”를 쓰고자 합니다.
아직 학습되지 않은 딜레땅트 수준의 대중적인 독자라면 난삽하고도 난해하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메타시를 쓰는 것은, 해체시의 매력을 떨칠 수 없기 때문,
예술의 순기능이 아방가르드에 있다는 점에서 외로운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를 쓰는 시인들이 반드시 고독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의외의 우호적인 독자를 만나는 기쁨에 행복감 또한 쏠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의 '하이쿠’
둘이서 보았던 눈, 올해도 그렇게 내리었을까 - 바쇼
산길 걷다가 나도 몰래 끌렸네, 제비꽃이여 - 바쇼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 - 바쇼
그믐밤 달은 없고, 천 년의 삼나무를 껴안는 광풍 - 바쇼
나무 뒤에서 숨어 차 따는 여인네도 듣누나, 소쩍새 울음 - 바쇼
카페 프란스 / 정지용
옮겨다 심은 棕櫚(종려)나무 밑에
빗두루 슨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쟈.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삐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멘트에 흐늙이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쟈.
이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또 한 놈의 心臟(심장)은 벌레 먹은 薔薇(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오 패롵(鸚鵡(앵무)) 서방! 굳 이브닝!』
『꾿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鬱金香(울금향) 아가씨는 이 밤에도
更紗(갱사) 커-틴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는 子爵(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大理石(대리석) 테이블에 닷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오, 異國種(이국종)강아지야
내 발을 빨어다오.
내 발을 빨어다오.
- 월간『學潮(학조)』창간호, 1926년 6월호에 발표
카페 프란스에서 정지용은,
1. 망국의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잃은 비애와 비극을 이국정서로 exotic하게 풀어낸다.
이국종 강아지에게 발바닥을 빨게 하는 자학적 행위의 표출.2. ‘프랑스’가 아닌 ‘프란스’로 쓴 이유① 소리의 낯섦, 이국성 강조‘프랑스’보다 ‘프란스’는 모음이 단조롭고 딱딱한 울림. ‘프랑스’가 정식 명칭이라면, ‘프란스’는 음성적으로 번역되지 않은 발음.‘France’를 불어식으로 “프ㅎ헝스”라 하지 않고, 서툴게 “프란스”라 말하는
의도가 느껴짐.② Franz(프란츠)sms 독일인 이름. ‘Franz’로 읽을 경우, 카페는 국가가 아닌 인물의 환치됨.
프란츠 카프카는 고독, 존재의 무의미, 자기 정체성의 분열을 다룬 작가이므로 이 시의 분위기와 일맥상통.③의도적 탈정형모더니스트로서 형식을 실험하는 시인. ‘프랑스’를 ‘프란스’로 표기함으로써, 현실의 프랑스를 지우고 자신의 상상력 안에 허구적 공간을 만들어낸 효과.
입맞춤 / 서정주(1915~2000)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자꾸 달아나고
울타리는 마구 자빠뜨려 놓고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사랑 사랑의 석류꽃 낭기 낭기
하늬바람이랑 별이 모두 우습네요
풋풋한 산노루떼 언덕마다 한 마리씩
개구리는 개구리와 머구리는 머구리와
구비 강물물은 서천으로 흘러내려…
땅에 긴 긴 입맞춤은 오오 몸서리친
쑥니풀 지근지근 니빨이 희허옇게
즘셍스런 웃음은 달더라 달더라 울음같이달더라
- *자오선 1937년 1월호에 발표
춘신(春信) / 유치환(1908~1967)
꽃등인 양 창 앞에 한 그루 피어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 가지 새로
작은 멧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메서
작은 깃을 얽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느뇨
앉았다 떠난 아름다운 그 자리에 여운 남아
뉘도 모를 한때를 아쉽게도 한들거리니
꽃가지 그늘에서 그늘로 이어진 끝없이 작은 길이여.
*시집 『생명의 서』1947년
‐---''''''-----'''''-‐--
꽃이 피는 나타샤 / 정윤천
꽃들은 모두 나타샤에게서 태어나지
나타샤는 지명이 아닐 수도 있어 총을 든 군인의 이름이거나 /수도원의 뾰족한 종탑 아래일 수도 있지
분명한 것은 나타샤가 나타난다는 데에 있어 / 그도 어차피 1월에서 12월 사이에 태어났을 거니까
해바라기처럼 길쭉한 걸음일 때도 있지 / 나타샤의 말투를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 말보다는 나타나기를 즐기는 나타샤
무거운 짐을 태운 트럭이 지나갈 때 / 공장에서 나온 남자들이 술집 안의 난로를 향해 / / 함부로 이거나 세차게 쳐들어갈 때에도 / 나타샤는 조금씩 길어나지 / 그것은 나타샤만의 좋은 버릇 중의 하나
입술에 연필을 문 정원사 아저씨가 / 나뭇가지에 빨간 새집을 매다는 커다란 집의 담장 안에서
나타샤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봐
지금까지 보다는 아름다워지게 될 거야 / 꽃이 피는 나타샤가 여기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는.
- *웹진《시산맥》2024년 여름호에 발표
가려워진 등짝 / 황병승(1970~2019)
오월, 아름답고 좋은 날이다
작년 이맘때는 실연(失戀)을 했는데
비 내리는 우체국 계단에서
사랑스런 내 강아지 짜부가 위로해주었지
'괜찮아 울지 마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짜부는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잘도 뛰어내려갔지
나는 골치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짜부야 짜부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을 텐데!' 소리치기도 귀찮아서
하늘이 절로 무너져 내렸으면 하고 바랐지
작년 이맘때에는 짜부도 나도
기진맥진한 얼굴로 시골집에 불쑥 찾아가
삶은 옥수수를 먹기도 했지
채마밭에 앉아 병색이 짙은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직은 안 죽어'
배시시 웃다가 검은 옥수수 알갱이를
발등에 흘렸었는데
어느덧 오월, 아름답고 좋은 날이 또다시 와서
지나간 날들이 우습고 간지러워서
백내장에 걸린 늙은 짜부를 들쳐업고 짜부가
짜부가 부드러운 앞발로 살 살 살
등짝이나 긁어주었으면 하고 바랐지
- 월간 《현대문학》 2010년 2월호)
보들레르 탄생 204주년 기념
-악의 꽃과 도시인의 우울, 그리고 견자들의 증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
근대 예술에 폭탄적 혁신을 가한 시인.
Le Frisson Baudelaire: 의식의 후리쏭(오한, 전율, 소스라침)
Le Chat / Charles Baudelaire
Viens, mon beau chat, sur mon cœur amoureux; / Retiens les griffes de ta patte, / Et laisse-moi plonger dans tes beaux yeux, / Mêlés de métal et d’agate. / Lorsque mes doigts caressent à loisir / Ta tête et ton dos élastique, / Et que ma main s’enivre du plaisir / De palper ton corps électrique, / Je vois ma femme en esprit. Son regard,/ Comme le tien, aimable bête,/ Profond et froid, coupe et fend comme un dard,/ Et, des pieds jusques à la tête, / Un air subtil, un dangereux parfum / Nagent autour de son corps brun.
고양이 / 샤를 보들레르
오라, 사랑에 빠진 내 심장으로 닥쳐오라
내 아리따운 고양이여.네 발톱은 감추고, / 너의 아름다운 눈동자 속에 내가 빠져들게 하라, / 금속과 마노가 뒤섞인 거기에 내 손가락이 / 머리와 유연한 등짝을 늘어지도록 애무할 때/ 그리고 내가 찌릿찌릿한 전기 같은 / 네 몸뚱이를 더듬어 도취 될 때, / 나는 내 여인의 에스프리를 본다. 그런 점에서,/ 너는 흡사 에스프리 그 자체, 사랑스러운 짐승이여, / 심오하게 깊고도 차갑게, 송곳처럼 찌르고 가르며, /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민한 기운과 위험천만한 향취가 / 그 검은 육체의 언저리를 어슬렁거린다.
1. 샤를 보들레르, 전율(소스라치는 경련)의 시인
보들레르는 단지 시인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 체계였다.그의 언어는 감성의 운율이 아니라, 의식을 뒤흔드는 진동이었다.『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 이 두 권의 시집은 프랑스 문학을 넘어예술의 지형을 다시 재편성한 ‘정신의 지도’이다.
2.『악의 꽃』 그 아름다운 잿빛의 심연1857년, 『악의 꽃(Les Fleurs du Mal)』이 출간되었을 때,
프랑스 문단은 충격과 당혹 속에 빠졌다.
추(醜)를 노래하고, 죄를 응시하며, 죽음과 퇴폐를
아름다움의 층위로 끌어올린 보들레르는 도덕적 탄압과
문학적 혁신 사이에 자신을 내던진다.
그 시집은 꽃이 아니라, 흉터였으나 19세기 시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되었다.
빅토르 위고는 유배지에서 『악의 꽃』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Ce nouveau frisson donne un frisson nouveau.”
—이 새로운 전율은, 새로운 전율(경악의 세계)을 낳는다.
3. 『파리의 우울』은 산문시의 서막
『악의 꽃』츨판 후 10년 만에 산문시집『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을 펴낸다.도시문명의 우울, 질병, 술, 군중, 섹슈얼리티, 고독, 광기 등을 시의 행과 연에 끌어내는 대신 산문시의 형식을 빌려 쓴 충격적인 시.
『악의 꽃』이 지옥의 송가라면, 『파리의 우울』은 지옥 속을 떠도는
고독한 산책자(플라뇌르flâneur)의 일기이다.
4. 견자Voyant들의 증언 :
(1) 빅토르 위고의 찬사
“의식을 소스라치게 하는 전율의 시”“그의 시는 별처럼 빛나며, 눈을 멀게 한다.”
(2) 당대의 평론가 생트 비브는,“병든 상상력의 정밀한 관찰자로서 괴기하지만, 기하학적이다.”
(3) 발레리는 정의한다.
“보들레르는 낭만주의의 최후이자, 상징주의의 첫 번째다.”
(4) 앙드레 지드는 일갈하기를,
“그는 사탄의 의복을 입었으나 그옷 속에서 진리의 광휘를 비췄다.”보들레르야말로
<이전의 시>를 모두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위험한 존재.그는 아름다움의 진실이 추함 속에도 깃들 수 있다는 것을,온몸으로 증명한다.
보들레르는,
고전적, 종교적, 영웅적 주제 대신 도시인의 고독과 산업화에 의한 인간 소외를 퇴폐적 감수성으로 담아냈다.
1. ‘악의 꽃’(Les Fleurs du Mal)
• 미의 범주를 확대: "추(醜) 속의 미"를 탐구함으로써, 퇴폐, 우울, 악, 죄, 병 등을 예술현장을 끌어들임.
• 검열과 재판에 시달렸으나, 저항하는 예술가의 상징이 됨,
2. 산문시(prose poetry)라는 실험정신
『파리의 우울』을 통해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물어 표현의 영역을 넓힘. 프랑스를 넘어 세계의 시인들(랭보뿐 아니라 프랑시스 퐁주, 앙드레 브르통, 미국의 앨런 긴즈버그 등)은 이 형식을 통해 초현실주의, 비트 문학 등을 발전시킴.
3. ‘거리의 산책자’(flâneur): 보들레르는 방황하는 관찰자로서 거리의 플라뇌르, 예술가는 관조적 존재가 아닌 실존적 참여적 존재.
4. 미학적 허무주의와 윤리의 경계 허물기: 보들레르는 술, 타락, 죽음, 섹스 등을 통해 악의 심연을 탐색.
20세기 실존주의(사르트르, 카뮈 등)로 이어지는 사유의 징검다리가 됨.
■ 정지용(1903년)충북 옥천 출생
1918년 휘문고보 재학 중『요람』발간
1930년 문학 동인지『시문학』동인
1933년 구인회 결성
1939년『문장』지에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박남수 추천
1945년 이화여대 교수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 위원
1950년 월북/납북
시집 : 정지용시집1935, 백록담1941, 지용시선1946
우리에겐 보들레르를 넘어서서 역치(閾値)가 높은 시를 써야 하는
아름답고도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enchanted 찬
tammy3m@daum.net 김영찬(2025년 4월 18일 저녁) (끝)
* 이 글은 김동우시집 출판기념회에서 특강으로 진행된 내용임
*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 동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2002년 계간 『문학마당』과 2003년 격월간『정신과표현』에 시가 있는 수필을 각각 게재, 연재한 것을 계기로 작품 활동 시작. 최근 시집 << 오늘밤은 리스본 >> 출간
오늘방은 리스본
하지만 오늘밤엔 리스본까지만
바르셀로나, 쌩 폴 드방스쯤이야 나중에 품어도 전혀 늦지 않아
북방의 주택가엔 주인 없는 개들만 어슬렁어슬렁
빠리의 쌩 제르맹 뒷골목에 나뒹구는 빈 포도주병들만
습관적인 휘파람 소리를 내더라도
오늘은 오직 리스본까디만,
몰도바
몰디브
몰라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더라도 결국
품 안에 끌어들여 일일이 쓰다듬게 될 무국적의 섬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야 없지
초저녁부터 야심한 밤까지 리스본의 불 꺼진 테라스에 기대어
고즈넉한 밤안개에 뜬금없는
칵테일 여행
진한 압생트 쑥 향에 코를 처박고
뜨거운 섬이 하나하나 가슴 복판에 솟구칠 때까지
집에 갈 생각
배낭 메고 딴 길로 샐 생각일랑 아예
접어둘 것
그렇고 말고 오늘처럼 과달키비르강이 소리 없이
강물 수위를 높이며 시종일관
침묵을 고집할 때
리스본의 매력은 무섭도록
관능적일 수밖에
달콤한 밤공기가 맨발의 우리들을 달빛 젖도록 사주할 테니
그래, 우린 몰도바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기다리는 척
남은 생애를 몽땅 대책없는 리스본의 창가에서 어기적거리다
옹골차게 우량한 쌍둥이들이나 뭉텅뭉텅
낳게 된들 누가 어쩌랴
리스본까지만, 제발 더 멀리 떠나서 탈이 될
헌책방들의 책들일랑
뚜껑 닫아버리고
오늘 밤엔 리스본까지만, 리스본의 품 안에 안겨서 오늘밤은 리스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영찬의 시는 주체, 중심이 없는 다양한 목소리가 뒤엉킨 상태에서 발화된 기표들의 직조물, 즉 퀼트 내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미셸 푸코의 말처럼 헤테로토피아가 다른 모는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김영찬의 시집은 다른 모든 시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체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시시각각 분열하는 언술이, 그 결과에 따라 파편처럼 흩뿌려져 있는 언표가 있을 따름이다.
그에게 시는 독자를 위로하거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언어는 감동이나 위로보다는 전쟁. 특히 언어의 층위에서 펼쳐지는 전투에 가깝다.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라는 마야코프스키의 말처럼 김영찬의 시는 대중의 기호나 취향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듯하다.
-고봉준 문학평론가
'시창작 도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생진 시인을 만나다 (1) | 2025.04.04 |
|---|---|
| 전쟁 후 가난하고 헐벗은 조국… 담담히 다가올 희망 그렸죠 (0) | 2025.03.27 |
| 글쓰기의 비법 (0) | 2025.03.04 |
| ‘월광’을 연주하듯 ‘풀’을 낭송하면 (0) | 2025.02.27 |
| 한 달만에 4쇄까지… 감성詩로 2030 마음 훔친 젊은 시인들 (1) | 2025.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