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편지] 더 좋은 나무 이야기를 찾으려 애쓰다가 한 권의 책 때문에……

하루 종일……. 한 권의 책을 찾느라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책장 어딘가에 틀어박혀있을 듯해서 책등만 나란히 드러난 책장을 한바퀴 훑었습니다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천칠 년에 출판된 책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이 책을 오래 전에 봤다는 건 착각이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책이어서 지금이라도 구하려고 인터넷 서점을 찾아보니 품절이었습니다. 혹시 중고도서로 구할 수 있나 싶어 검색해보니, 몇 권의 책이 있었고,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에도 값은 애초 정가의 네 배 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고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책의 가치는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품절된 좋은 책의 값은 천정부지로 매기는 게 다반사이거든요.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시립도서관에서 검색해보니, 집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대출 가능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키지 않은 건, 제 독서 습관 때문이지요. 어떤 책이든, 심지어 소설 책이라 해도 적지않은 표시와 메모를 남기는 게 오래된 제 독서 방식인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중고서점과 도서관에서 제가 찾는 책의 소재만 확인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인터넷서점의 ‘내가 구매한 도서’ 리스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뿔싸! 이 책은 이천십 년 봄에 구입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책장 어딘가에 있을텐데 찾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쉽지 않겠지만 다시 찾아야 했지요. 새 책을 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시간 들이지 않고 새 책을 한 권 더 구입하는 걸로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경우가 좀 다르네요. 책은 품절 상태고, 중고도서의 값은 너무 비싸고, 도서관 책은 내 독서 방식에 맞지 않고……. 어쩌겠어요. 찾아야만 하겠지요. 다시 책을 찾기로 마음 먹고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얄따란 책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더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만, 찾는 책은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럴 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소설 제목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당장 이 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읽는 중인 책에서 이 책의 일부를 인용한 문장을 보면서, 내가 읽은 책이지 싶은 생각에 앞뒤 문맥을 살피며 들춰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확인하려 한 게 전부거든요. 이 책이 아니라 해도 지금 당장 읽어야 할 책은 곁에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기왕에 찾으려 한 마음은 쉬이 내려놓아지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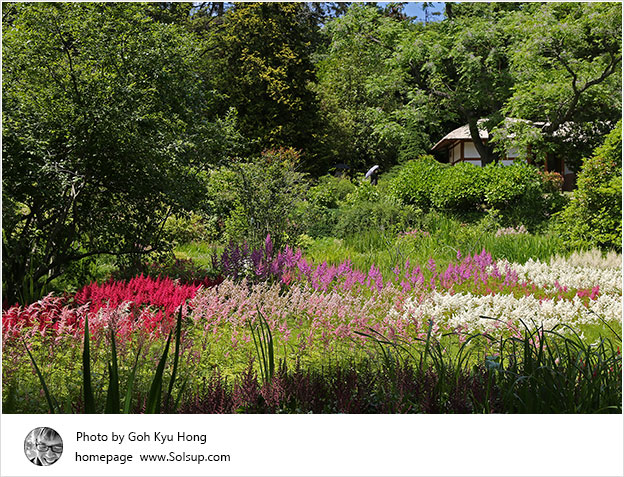
답답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책을 꼭 찾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깁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이 책을 찾는다 해도 곧바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찾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말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좁다란 작업실 책장에 두 겹으로 꼽아놓은 겉면의 책들을 한 블록씩 빼내 옮겨가면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의 표지는 확인했지만, 책등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책을 찾기 어려운 요인이 될 겁니다. 이천칠년 유월에 출간한 책이니, 비교적 빛은 바랬을 것이고, 416페이지 분량이니 종이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께는 대략 1.5센티미터에서 2센티미터 쯤 되리라 여기고 다시 하나둘 짚어봅니다.

찾는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래 전에 읽었던 책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책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두 권이 눈에 들어와 살펴보면 두 권 모두에 밑줄과 표지가 들어있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읽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처음 나무를 찾아 길 위에 오를 힘을 주었던 감동적인 책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 그 무지했던 시절의 어리석음이 떠오르고, 책 곳곳에 ‘플래그’라고 불리는 표지를 빼곡이 붙여놓고, 일일이 베껴 쓴 책이 보이면 초조하고 절박하게 공부에 매달리던 때도 떠오릅니다. 책장에 묻힌 책 무더기 속에서 한 권의 책을 찾는 일은 내 생각의 역사를 짚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벗들이 성의 있게 속표지에 사인을 담아 보내준 책들도 보입니다. 벗들과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리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뜻밖에 명을 달리한 가까운 벗이 남긴 ‘명저’라 할 만한 책도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누군가가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써낸 아름다운 책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슬피 우는 저를 위로하느라 고등학생이던 딸 아이가 제게 건네준 동화책 《너무 울지 말아라》는 어쩔 수 없이 꺼내어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장은 그러니까 '생각의 역사'일 뿐 아니라,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쌓인 먼지들이 폴폴 솟아오르며 코는 매캐해지고 기침은 이어집니다. 그래도 책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찾는 일은 잃어버린 내 생각의 한 조각을 되찾으려는 안간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익숙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쉬클로프스크의 ‘낯설게하기’를 생각한 때문이었지요.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는 책이어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뒤로 물러서서 책장의 맨 위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바닥에 엎드렸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돌아봅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빌려갔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했지만, ‘대지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애니 딜라드처럼 지난 이십 년 동안 작업실을 비공개로 해온 까닭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쌓인 먼지를 뒤집어 쓰며 책장에 바투 다가섰다가,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바짝 다가서서 한 권 한 권 들춰내기도 하고……. 오전에 시작한 '책 한 권 찾기'는 점심을 먹고나서 또 처음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창 밖이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이천칠 년에 출판되고, 이천십 년에 사서 읽었으며, 지금은 품절되고, 중고서점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그 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필경 언젠가 뜻밖의 자리, 어이없는 구석자리에서 찾아지기는 할 겁니다. 그때에도 다시 이 책을 뒤적여야 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생각 한 조각을 쿱쿱한 작업실 먼지 속에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나무편지》에서는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긴하지 않게 보낸 하루 풍경을 그대로 적어 올립니다. 《나무편지》에 담은 사진은 오래 된 사진첩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오늘 《나무편지》 내용이 그런 것처럼 난데없이 끄집어낸 것들입니다. 다음 《나무편지》에서는 더 좋은 나무 이야기 전해드리기로 약속드리고 오늘의 주절거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칠월 열여드렛 날 아침에 …… 솔숲에서 고규
'고규홍의 나무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성의 고된 삶을 위로하기 위한 ‘위민정’을 지켜온 팽나무 (0) | 2022.08.23 |
|---|---|
| [나무편지] 이름만으로도 무더위를 식혀줄 듯한 물푸레나무 큰 나무 한 그루 (0) | 2022.08.08 |
| 사람살이를 위해 사람이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 (0) | 2022.07.14 |
| 수목장…… 그리고 오래된 숲에서 신비롭게 피어난 자귀나무 꽃 (0) | 2022.07.04 |
| [나무편지] 꽃 없어도 좋지만 그래도 꽃을 기다리게 되는 여름의 절집 나무 (0) | 2022.0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