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4.12 03:04 | 수정 : 2017.04.12 08:17
[77] 고구려에서 대한민국까지… 임진강 고랑포구에 흘러간 역사
연천과 파주에 흐르는 임진강
임진나루와 고랑포에 새겨진 기이한 흔적들
고구려가 세운 절벽 요새 호로고루는 봄 햇살에 빛나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은 그 아래 고랑포를 못 건너고 연천 땅 언덕에 잠들어
임진왜란 개전 직후 조선 14대 왕 선조, 임진나루로 야반도주… 국격(國格)은 땅바닥에
대한민국시대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 부대… 고랑포 물길 건너서울까지 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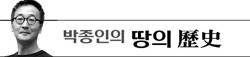
사진 한 장에 1500년 역사가 담겨 있다. 사진 속 강은 임진강이고 양안을 잇는 포구 이름은 고랑포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잇는 고랑포와 임진나루에서는 몇백 년에 한 번씩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5세기 광개토왕 무렵 고구려는 포구 남동쪽 절벽에 호로고루를 건설했다. 500년 뒤 고려 경종 3년 978년 4월, 고랑포 북쪽 언덕에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묻혔다. 경주 바깥에 있는 유일한 신라왕릉이다. 또 600년이 흐른 1592년 4월 조선의 왕 하나가 고랑포구 남서쪽 임진나루에서 피란길에 올랐다. 40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시대 1968년 1월 19일 중무장한 공비 떼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 청와대로 달려간 곳도 고랑포였다.
1592년 4월 임진나루
5세기 광개토왕 무렵 고구려는 포구 남동쪽 절벽에 호로고루를 건설했다. 500년 뒤 고려 경종 3년 978년 4월, 고랑포 북쪽 언덕에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묻혔다. 경주 바깥에 있는 유일한 신라왕릉이다. 또 600년이 흐른 1592년 4월 조선의 왕 하나가 고랑포구 남서쪽 임진나루에서 피란길에 올랐다. 40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시대 1968년 1월 19일 중무장한 공비 떼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 청와대로 달려간 곳도 고랑포였다.
1592년 4월 임진나루

1592년 임진년 음력 4월 화성(火星)이 남쪽 하늘 궁수자리를 범했다. 전쟁이 터질 징조였다. 과연 임진왜란이 터졌다. 마흔 살에 접어든 사내 이연(李昖)은 그달 많은 보고를 받았고 많은 결재를 행했다. 이연은 조선왕조 14대 왕, 선조(宣祖)다. 선조수정실록 4월 기사를 본다. 다음은 그 일부다.
'부산진 부사 정발과 송상현 전사(戰死), 경상좌수사 박홍 도주, 일본군 밀양 침략, 상주에서 이일 부대 패배, 동지중추부사 이덕형을 일본군에 사신으로 파견, 기성부원군 유홍이 경성에서 사직과 함께 죽자고 상소, 충주에서 신립 전사, 충주 시민 참살.' 마지막 기록은 이렇다. '(왕이탄) 가마가 모래재를 넘었다.' 풍경은 임진강변 나루터로 이어진다.
그 달 30일 폭우가 쏟아지는 암흑 속에 선조 일행이 임진나루에 도착했다. 179년 전 2월 태종이 세자와 함께 '거북선이 모의 왜선과 전투하는 훈련 상황을 구경하던(태종실록 태종 13년 2월 5일)' 바로 그 나루터였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나루터 사무실인 승청(丞廳)을 불태워 겨우 어둠을 뚫고 강 건너 동파역(東坡驛)에서 몸을 쉬었다.
장차관급 문관(文官)이 대부분인 수행원 86명 가운데 내시가 24명, 마구간지기가 6명, 심부름꾼 2명, 허준을 비롯한 의사가 2명이었다. 이들은 굶주리고 지쳐 촌가(村家)에 흩어져 잠을 청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 한 달 뒤 왕을 수행하던 사관(史官) 조존세·김선여·임취정·박정현 네 명이 사초(史草)를 불태우고 도주했다. 권력 무리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했다. 국격(國格)은 무너졌다. 전쟁이 조선을 휩쓸었다.
임진나루와 화석정
임진나루 북동쪽 절벽에 화석정(花石亭)이 있다. 군부대에 에워싸인 이 정자를 두고 신화 같은 얘기가 몇 가지 전한다.
화석정에는 '율곡 이이가 여덟 살에 썼다'는 팔세부시(八歲賦詩) 표석이 서 있다. 파주 출신인 이이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시다. 그런데 1934년 7월 1일 자 동아일보에 노산 이은상이 기고한 기행문 '적벽유(赤壁遊)' 마지막 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화석정에 걸린 시판을 보니 그 시는 昌寧後人 梅蓮居士(창녕후인 매련거사)의 작임을 알겠더이다. 시(詩) 작자(作者)의 오전(誤傳)처럼 섭섭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현판은 6·25전쟁 때 사라졌으니 진위 알 길은 막막하다.
민간에 전하기로는 율곡 이이가 생전에 피란길을 예견하고 기름을 먹여뒀던 화석정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화석정과 임진나루는 거리가 600m가 넘는다. 악천후 속에 불길을 보기에는 너무 멀다. 기록 또한 없다. 영조 때 채제공이 지은 '번암집(樊巖集)'에는 선조를 수행한 이광정이라는 문신의 노비 애남(愛男)이 나루 양안 갈대숲에 불을 질렀다고 기록돼 있다. 채제공은 이광정의 외손이다.
1500년 전 고랑포, 고구려
한반도 중간지대 동쪽은 산악이다. 서쪽 평야지대는 임진강이 남과 북으로 가른다. 임진강에서 가장 폭이 좁고 얕은 곳이 바로 임진나루와 고랑포다. 한양에서 평안도 의주까지 조선시대 의주대로는 임진나루를 지났다. 삼국시대 신라와 고구려 국경은 고랑포에서 결정됐다. 고구려가 평양에서 신라로 가는 최단 코스가 개성~장단~고랑포였다.
'부산진 부사 정발과 송상현 전사(戰死), 경상좌수사 박홍 도주, 일본군 밀양 침략, 상주에서 이일 부대 패배, 동지중추부사 이덕형을 일본군에 사신으로 파견, 기성부원군 유홍이 경성에서 사직과 함께 죽자고 상소, 충주에서 신립 전사, 충주 시민 참살.' 마지막 기록은 이렇다. '(왕이탄) 가마가 모래재를 넘었다.' 풍경은 임진강변 나루터로 이어진다.
그 달 30일 폭우가 쏟아지는 암흑 속에 선조 일행이 임진나루에 도착했다. 179년 전 2월 태종이 세자와 함께 '거북선이 모의 왜선과 전투하는 훈련 상황을 구경하던(태종실록 태종 13년 2월 5일)' 바로 그 나루터였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나루터 사무실인 승청(丞廳)을 불태워 겨우 어둠을 뚫고 강 건너 동파역(東坡驛)에서 몸을 쉬었다.
장차관급 문관(文官)이 대부분인 수행원 86명 가운데 내시가 24명, 마구간지기가 6명, 심부름꾼 2명, 허준을 비롯한 의사가 2명이었다. 이들은 굶주리고 지쳐 촌가(村家)에 흩어져 잠을 청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 한 달 뒤 왕을 수행하던 사관(史官) 조존세·김선여·임취정·박정현 네 명이 사초(史草)를 불태우고 도주했다. 권력 무리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했다. 국격(國格)은 무너졌다. 전쟁이 조선을 휩쓸었다.
임진나루와 화석정
임진나루 북동쪽 절벽에 화석정(花石亭)이 있다. 군부대에 에워싸인 이 정자를 두고 신화 같은 얘기가 몇 가지 전한다.
화석정에는 '율곡 이이가 여덟 살에 썼다'는 팔세부시(八歲賦詩) 표석이 서 있다. 파주 출신인 이이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시다. 그런데 1934년 7월 1일 자 동아일보에 노산 이은상이 기고한 기행문 '적벽유(赤壁遊)' 마지막 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화석정에 걸린 시판을 보니 그 시는 昌寧後人 梅蓮居士(창녕후인 매련거사)의 작임을 알겠더이다. 시(詩) 작자(作者)의 오전(誤傳)처럼 섭섭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현판은 6·25전쟁 때 사라졌으니 진위 알 길은 막막하다.
민간에 전하기로는 율곡 이이가 생전에 피란길을 예견하고 기름을 먹여뒀던 화석정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화석정과 임진나루는 거리가 600m가 넘는다. 악천후 속에 불길을 보기에는 너무 멀다. 기록 또한 없다. 영조 때 채제공이 지은 '번암집(樊巖集)'에는 선조를 수행한 이광정이라는 문신의 노비 애남(愛男)이 나루 양안 갈대숲에 불을 질렀다고 기록돼 있다. 채제공은 이광정의 외손이다.
1500년 전 고랑포, 고구려
한반도 중간지대 동쪽은 산악이다. 서쪽 평야지대는 임진강이 남과 북으로 가른다. 임진강에서 가장 폭이 좁고 얕은 곳이 바로 임진나루와 고랑포다. 한양에서 평안도 의주까지 조선시대 의주대로는 임진나루를 지났다. 삼국시대 신라와 고구려 국경은 고랑포에서 결정됐다. 고구려가 평양에서 신라로 가는 최단 코스가 개성~장단~고랑포였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임진강을 쟁취한 고구려는 강변에 요새를 쌓았다. 이름은 호로고루(瓠蘆古壘)다. 임진강 옛 이름 호로강(瓠蘆江)에서 따왔다. 임진강 유역을 정복한 고구려는 강변 산중에 20군데가 넘는 산성을 쌓았다.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임진강변도 신라 땅이 됐다. 호로고루 고구려 유적층 위로 신라 유적층이 발굴됐다. 고구려 산성 또한 신라, 고려, 조선대에 재활용됐다. 적(敵)을 물리치고 나면 재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1000년 전 고랑포, 그리고 경순왕릉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임진강변도 신라 땅이 됐다. 호로고루 고구려 유적층 위로 신라 유적층이 발굴됐다. 고구려 산성 또한 신라, 고려, 조선대에 재활용됐다. 적(敵)을 물리치고 나면 재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1000년 전 고랑포, 그리고 경순왕릉

그리고 신라가 망했다. 왕건에게 투항한 마지막 왕 경순왕은 왕건 사위가 되었다. 고려 수도 개경에서 왕건보다 35년을 더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조상들 묻힌 망국 수도 경주로 향하던 관(棺)은 고랑포를 건너지 못했다. 전하기로는 신라 유민(遺民)들 봉기를 우려한 고려 왕실이 '왕의 무덤은 수도에서 100리 밖에 두지 못한다'고 운구를 멈추게 했다. 경순왕은 결국 고랑포를 코앞에 두고 북쪽 언덕에 묻혔다.
오랜 세월 잊혔던 왕릉은 1746년 10월 경주 김씨 후손들이 '金傅大王(김부대왕·경순왕의 이름)'이 적힌 묘지석과 '敬順王(경순왕)'이 적힌 비석을 발견해 이듬해 왕명을 받들어 정비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와중에 흔적 없이 사라졌던 왕릉은 대한민국시대인 1973년 1월 민통선 수색중대장 대위 여길도가 총탄 자국 선명한 '신라 경순왕지릉' 비석을 풀더미 속에서 찾아내 환생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경순왕릉을 민통선 한계선에서 해제했다. 주차장에서 왕릉 오르는 길 양편, 그리고 왕릉 뒤편 철책 너머는 지금도 지뢰밭이다.
1968년 1월 고랑포와 무장공비 김신조
오랜 세월 잊혔던 왕릉은 1746년 10월 경주 김씨 후손들이 '金傅大王(김부대왕·경순왕의 이름)'이 적힌 묘지석과 '敬順王(경순왕)'이 적힌 비석을 발견해 이듬해 왕명을 받들어 정비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와중에 흔적 없이 사라졌던 왕릉은 대한민국시대인 1973년 1월 민통선 수색중대장 대위 여길도가 총탄 자국 선명한 '신라 경순왕지릉' 비석을 풀더미 속에서 찾아내 환생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경순왕릉을 민통선 한계선에서 해제했다. 주차장에서 왕릉 오르는 길 양편, 그리고 왕릉 뒤편 철책 너머는 지금도 지뢰밭이다.
1968년 1월 고랑포와 무장공비 김신조

고랑포가 가진 전술적 가치는 20세기에 또 한 번 증명됐다. 바로 김신조부대다. 1968년 1월 19일 평양에서 남파된 특수부대가 얼어붙은 고랑포를 건넜다. 원래는 선조가 건넜던 동파리와 초평도 사이 물길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하필 밀물 때라 물길이 너무 거셌다.
그래서 그 옛날 고구려 군사 남하 루트가 고스란히 재연된 것이다. 연천에서 파주로 진입한 공비들은 초인적인 스피드로 법원리 초리골을 지나 서울 삼청동으로 진군하다가 일망타진됐다. 김신조에 따르면 "훈련 내려와서 문산 술집에 외상을 그어놓고 돌아가면 고정간첩이 외상값 갚았다." 기관단총 31정, 실탄 9300발, 권총 31정, 대전차 수류탄 252발과 방어용 수류탄 252발, 단검 31정으로 중무장한 특수부대 부대원 진술에 세상이 식겁했다. 평화로워야 마땅할 임진강변에 철책이 늘어났다. 그 도화선이 바로 이 사진 속 포구, 고랑포다.
고랑포와 두 허씨(許氏) 허목과 허준
고랑포와 임진나루를 건너면 파주 진동면이 나온다. 민통선 이북 지역이다. 아름답던 동파리 백사장은 1990년대 일산 신도시 건설 때 다 파내서 사라졌다. 임진나루 건너 동파리를 잊지 못하던 실향민들은 이러저러 노력 끝에 2003년 동파리에 해마루촌이라는 정착마을을 만들었다. 미리 연락하면 관광객도 받는 개방된 체험마을이다.
1993년 미국 사는 고문서 연구가 이양재가 이곳 하포리 언덕에서 비석 조각을 찾아냈다. 후손들 의뢰로 시작한 조사에서 '陽平(양평)' '聖功臣(성공신)' '浚(준)'이라고 여섯 글자가 새겨진 동강 난 비석이 나왔다. 전쟁 때 선조 임금을 잘 수행했다는 '호성공신(扈聖功臣)', 의관 허준(1539~1615) 묘였다. 허준은 본관이 양천이다.
그래서 그 옛날 고구려 군사 남하 루트가 고스란히 재연된 것이다. 연천에서 파주로 진입한 공비들은 초인적인 스피드로 법원리 초리골을 지나 서울 삼청동으로 진군하다가 일망타진됐다. 김신조에 따르면 "훈련 내려와서 문산 술집에 외상을 그어놓고 돌아가면 고정간첩이 외상값 갚았다." 기관단총 31정, 실탄 9300발, 권총 31정, 대전차 수류탄 252발과 방어용 수류탄 252발, 단검 31정으로 중무장한 특수부대 부대원 진술에 세상이 식겁했다. 평화로워야 마땅할 임진강변에 철책이 늘어났다. 그 도화선이 바로 이 사진 속 포구, 고랑포다.
고랑포와 두 허씨(許氏) 허목과 허준
고랑포와 임진나루를 건너면 파주 진동면이 나온다. 민통선 이북 지역이다. 아름답던 동파리 백사장은 1990년대 일산 신도시 건설 때 다 파내서 사라졌다. 임진나루 건너 동파리를 잊지 못하던 실향민들은 이러저러 노력 끝에 2003년 동파리에 해마루촌이라는 정착마을을 만들었다. 미리 연락하면 관광객도 받는 개방된 체험마을이다.
1993년 미국 사는 고문서 연구가 이양재가 이곳 하포리 언덕에서 비석 조각을 찾아냈다. 후손들 의뢰로 시작한 조사에서 '陽平(양평)' '聖功臣(성공신)' '浚(준)'이라고 여섯 글자가 새겨진 동강 난 비석이 나왔다. 전쟁 때 선조 임금을 잘 수행했다는 '호성공신(扈聖功臣)', 의관 허준(1539~1615) 묘였다. 허준은 본관이 양천이다.

연천에는 양천 허씨 집성촌이 있다. 조선 중기 집권 여당의 정신적 리더 우암 송시열(1607~1689)에 반론을 제기한 용감무쌍한 정치가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이 이곳 왕징면 강서리에 잠들어 있다. 생전에 자기 무덤에 쓸 비석 비문을 미리 써둔 호탕한 사내였다. 동방제일이었다는 그의 전서체(篆書體) 글씨는 귀기(鬼氣)가 느껴질 정도로 신비하다. 오죽하면 '허목의 글씨는 광서괴행(狂書怪行)이니 없애야 한다'는 시비까지 나왔을까. 허목은 이에 대해 '창밖에 안개 가득하니 바깥일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응수했다(허목 문집 '기언(記言)'). 묘소로 가는 길은 검문소를 거쳐야 한다.
권력을 두고 논박한 정치가들이니 선악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거물을 두고 임진강변에 떠도는 설화 하나에 귀를 기울여 본다. 송시열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다. 백약이 무효라 결국 송시열은 아들을 시켜 의술에 정통한 정적(政敵) 허목에게 처방을 받아오게 했다. '독약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아들이 가서 약방문을 받아오니 과연 독극물인 비상(砒霜)이 있었다.
의심과 효심 가득한 아들이 비상 양을 줄여 약을 지으니, 차도가 있되 완쾌가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이 허목을 찾아가니 처방대로 비상을 다 쓰라
자, 다시 임진강을 보니 천년 요새가 봄햇살에 빛나는 것이었다. 천년 세월 강심(江心)을 무법(無法)으로 훑고 지나간 역사가 반짝이는 것이었다
권력을 두고 논박한 정치가들이니 선악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거물을 두고 임진강변에 떠도는 설화 하나에 귀를 기울여 본다. 송시열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다. 백약이 무효라 결국 송시열은 아들을 시켜 의술에 정통한 정적(政敵) 허목에게 처방을 받아오게 했다. '독약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아들이 가서 약방문을 받아오니 과연 독극물인 비상(砒霜)이 있었다.
의심과 효심 가득한 아들이 비상 양을 줄여 약을 지으니, 차도가 있되 완쾌가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이 허목을 찾아가니 처방대로 비상을 다 쓰라
자, 다시 임진강을 보니 천년 요새가 봄햇살에 빛나는 것이었다. 천년 세월 강심(江心)을 무법(無法)으로 훑고 지나간 역사가 반짝이는 것이었다
'그곳이 가고 싶다(신문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성 편백나무숲 (0) | 2017.05.26 |
|---|---|
| 문경 (0) | 2017.05.25 |
| 전남 고흥 (0) | 2017.04.02 |
| 백범이 걷던 길 따라 솔향 그윽하다 (0) | 2017.03.12 |
| 정선 (0) | 2017.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