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편지] 젊은 비구니 스님과 나눈 나무 이야기 … 그리고 EBS-TV

[나무편지] 젊은 비구니 스님과 나눈 나무 이야기 … 그리고 EBS-TV

★ 1,291번째 《나무편지》 ★
주지 스님이 출타 중인 남도의 아늑한 절집, 일주문도 천왕문도 해탈문도 없는 작은 절집. 오래 전에 이 자리에 절이 있었다는 흔적인 오층석탑 한 기가 남아 있지만, 옛 절의 자취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기의 오층석탑에 기대어 오래 전에 이 자리에 절이 있었으리라는 짐작만으로 새로 지은 절, 진도 상만리 구암사입니다. 나무 찾아 떠도는 운수납자를 편안하게 맞이하신 젊은 비구니 스님과 차 한 잔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고요한 절집에 공부하러 와 있는 스님, 세속의 말로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잠시 들르듯 머무르는 젊은 스님이 이 마을의 터줏대감처럼 서 있는 오래된 나무의 속내를 알 리 없겠지만, 그윽한 차 향을 마주하고 하릴없이 나무 이야기를 여쭈었습니다. 절집 마당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 절집 아랫 마을이 끝나는 빈터에 서있는 육백 년 된 비자나무에 대한 질문이었지요. 오래 전부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갸우뚱했던 건, “언제 누가 이 자리에 심었을까”였습니다. 나무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 나무는 사람살이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통한 나무여서, 나무에 기어오르다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으며, 마을 당산나무로 당산제를 지내는 나무입니다.

짐작대로 젊은 비구니스님께 궁금증을 풀 답을 얻디는 못했습니다. 이 절집에 머무르신 게 고작해야 두 달도 채 안 되는 분이었으니,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 이야기는커녕 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마을 사람살이를 속속들이 알 리 없지요. 스님도 나무가 좋아 나무 그늘에 자주 들곤 한다는 이야기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편안히 다실에 스민 차향을 음미하며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는 모두 잊어지고, 스스로를 ‘공부 중’이라고 하신 젊은 학승의 맑은 눈빛만 오래 남았습니다.

나무의 내력보다는 진도의 아름다운 풍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스님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진도의 여러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맑은 차향과 함께 흐르는 차공양은 달콤했습니다. 찻잔이 비워진 한참 뒤까지도 스님의 이야기 공양은 이어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스님은 찻잔을 거두시며 다른 스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나무 이야기를 알아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무 이야기는 아쉬웠지만, 세상의 모든 나무가 좋다는 젊은 비구니 스님과의 차공양은 나무와의 만남만큼 좋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절집 구암사 앞 비탈 빈터에 서 있는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는 6백 년쯤 살아온 걸로 짐작되는 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 그루의 비자나무 가운데 한 그루이지요. 나무높이 12미터, 가슴높이줄기둘레는 6.5미터, 뿌리둘레는 7.5미터 가까이 되는 이 비자나무는 규모에서 대단히 큰 나무는 아니지만, 생김새만큼은 옹골찹니다. 언제 누가 심은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옛 절집의 흥망성쇠를 또렷이 지켜본 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스님과 차 공양을 함께 한 절집, 구암사는 새로 지은 절집입니다. 절집 뒷산에 ‘비둘기 바위’, 한자로 ‘구암(鳩巖)’으로 부르는 큰 바위가 있어서 구암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자리는 ‘상만사터’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상만사’라는 절집의 자취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 이름이 오래 전부터 ‘상만리’라고 불렸던 걸 바탕으로 ‘상만사’라는 절집이 있지 않았을까 할 뿐입니다. 오래된 흔적이라 해야 절집 앞마당에 있는 오층석탑이 유일합니다. 통일신라의 양식을 가졌지만, 실제 조성은 고려 때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석탑입니다. 이 석탑을 근거로 이 자리에 고려 시대에 번창한 절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는 겁니다.

절집의 들고남은 나무의 속내에 간직한 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무는 마을의 쉼터이면서 사람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과 오래도록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나무와 사람의 생명살이가 똑같을 수 없고, 사람과 나무가 완벽하게 소통하는 언어가 마련될 수 없는 게 이 땅의 이치이거늘, 나무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더 이상 안달할 수 없겠지요. 그건 어쩌면 나무에 대한 혹은 생명의 원리에 대한 불경한 노릇일지 모르겠습니다. 크고 오래 된 나무를 바라본다는 건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양의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고, 그 아쉬움은 곧 다른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 한낮에 EBS-TV의 ‘ebs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인 정관용 선생님과 이 땅의 큰 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찾아주셨고, 《나무편지》를 함께 나누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오랫동안(26년 동안) 적어도 한 주일에 한 통씩 빠짐없이 띄워 온 《나무편지》입니다. 가끔은 한 주 정도 거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제가 곧 나올 새 책 《고규홍의 나무》(동아시아)의 마무리와 후속 작업 준비로 마음의 겨를이 모자라서 더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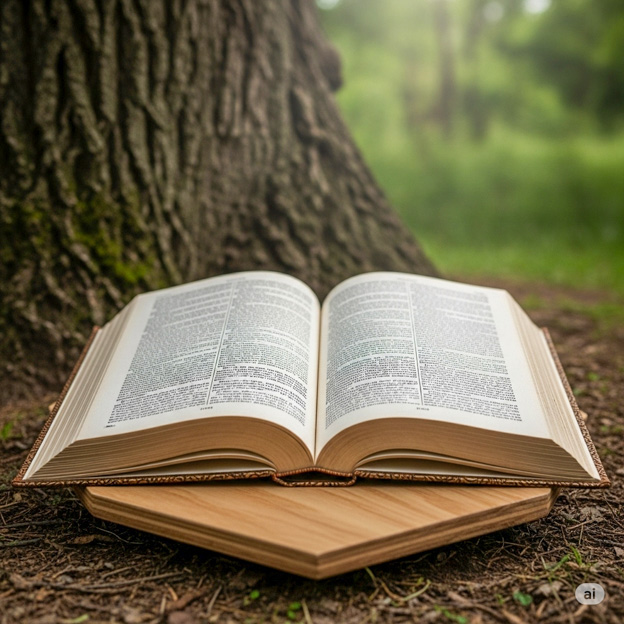
그런 와중에 《나무편지》에 대한 기대와 성원으로 새로 찾아오신 분들을 맞게 되면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편지 글에 마음을 담게 됩니다. 시간에 쫓겨 에멜무지로 띄우곤 하는 《나무편지》에 성의를 더 하게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감사 인사 올립니다.
참! 한 말씀 덧붙입니다. EBS-TV의 ‘ebs초대석’은 본방송과 함께 여섯 차례의 재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직 세 차례의 재방송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6/9 월 24:30 EBS-1TV / 6/13 금 21:00 EBS-Plus2 / 6/13 금 22:00 EBS-2TV] 그리고 유투브의 ‘EBS 교양채널’에는 약 2주 뒤에 업로드한답니다. 새로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며 우리 곁의 나무를 한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월 9일 아침에 1,291번째 《나무편지》 올립니다.
- 고규홍 드림